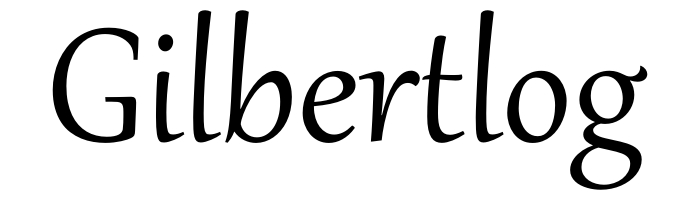
불교의 향기를 느끼다
어제의 아주 짙은 먼지가 싫었는지 밖에 나서기가 두려웠다. 목은 칼칼하고(마치 감기가 걸린 사람처럼) 코는 훌쩍거리고 목은 부었는지 약간의 통증까지 있었다. 카트만두는 도저히 살 곳이 못된다고 어찌나 투덜거렸는지. 도착한 날과 어제, 딱 이틀 걸었을 뿐인데 나름 면역이 좋다고 자부하는 나의 몸을 이렇게까지 만든 도시의 흙먼지가 싫었다. 해가 창을 통해 쨍쨍소리를 내며 들어오고 나서야 어제 입었던 바지를 바라보았는데, 곤색 바지가 색이 바래진 것처럼 뿌옇게 변해 있었다. 곧장 밖으로 나가서 바지를 털어냈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삼년은 묵어야 나올법한 먼지들(모래폭풍인 줄)이 떨어졌다. 아무리 돈없고 가난한 여행이라 할지라도 이정도의 먼지는 싫어 바지를 신나게 두들겨 팼다. 무슨 소화기인줄?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걷기이긴 한데, 카트만두의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혼자서 길을 찾다간 제풀에 지치곤 한다. 결국 카트만두의 거친 흙먼지와 복잡한 미로로부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택시의 도움을 빌렸다. 택시 기사조차도 차안에 있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운전을 할 정도이니 스와얌부나트까지 걸었으면 사막을 경험할 뻔 했다. 차 안에서 자동차의 경적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니 그나마 나았다. 예전에 주간 칼럼을 읽다가 김년균 작의 '낮은 곳'의 한 문구를 보았는데 '보기엔 높은 곳이 좋지만, 살기엔 낮은 곳이 더 낫다. 낮아서 아무렇게나 살기에 부담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내가 사는 곳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고 지저분한 곳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를 잘 알 것 같다. 하지만 먼지는 여전히 적응 불가다.
스투파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면서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놈들이 저놈들인데, 스와얌부나트의 다른 이름이 '몽키템플'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 정도로 원숭이들이 많다.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나쁜(최소한 나에겐) 원숭이들에 비하면 온순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이놈들이 왔다갔다하며 장난스러운 몸짓을 보여주는 탓에 올라가는 길이 심심하지는 않다. 중간에 노점도 많아서 기념품으로 삼을만한 것도 꽤 구경할 수 있다. 나도 올라가는 길에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호객을 해서 무언가 싶어 관심있게 들여다 보았는데, 한 번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은 것과 같은 마니차(불교 경전을 넣은 원통형의 경통)를 돌에 조각해서 팔고 있었다. 불교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마니차를 250루피(물론 바가지겠거니 알고 그냥 샀다)를 주고 샀는데 당시에는 오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던 것이 돌이 녹아내려 온통 까맣게 변해버렸다(ㅠㅠ). 가격을 바가지 쓴 거는 이해하겠는데, 내 소중한 기념품 ㅠㅠ 그래도 여행하는 내내 목에 걸고 다니며 내 안전을 기도해 준 기특한 놈이다.

숨이 턱! 하고 막힐 정도로 높았던 이 곳. 스투파가 있는 정상에 도착하니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밑에서 나를 신나게 괴롭히던 먼지도 없다. 스투파 근처를 오색으로 두르고 있었던 흰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의 '룽따'를 볼 수 있다. 하늘, 땅, 바람, 바다, 해를 의미하는 각각의 오색의 기에는 티벳 경전이 새겨져 있고(검은색의 잘잘한 글씨로), 부다의 가르침이 바람처럼 빠른 말을 타고 널리널리 퍼져가라는 뜻이라고 한다. 가끔 티벳을 배경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룽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곤 했는데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됐다. 고원 주변에는 바다가 없는데, 바다라는 의미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살짝 궁금하긴 했다. 바다를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그들의 염원인가? 나중에 네팔리안 친구가 생기면 꼭 물어보아야 겠다.
일단 스투파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곳을 찾는 모든 사람이 저것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것을 돌리는 의미를 모르는 관광객들조차도 군중심리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돌리며 사진을 찍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것들은 '마니차'라고 하는 것들인데, 마니차를 돌리는 것은 경전을 한 번 읽는 것과 같아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나도 군말 않고 실행. 종교도 없고, 행운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특별한 곳에 가면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미션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왼손으로 돌리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는데, 어떤 늙은 할아버지께서 그러지 말란다. 오른손으로 돌리고 시계방향으로 돌아야 한다고 ㅋㅋ 스투파 주변을 두르고 있는 마니차들을 한개도 빼놓지 않고 모두 돌리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소원을 하나 빌었다(이건 비밀). 현지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자연스러운데, 내가 하면 낯간지럽고 어색하기만 하다. 종교적인 믿음은 한참 부족한가보다.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한 거리에 있는 룽따 사이로 부다아이의 눈이 보였다. 익살스럽게 표현된 이 문양은 '진실은 하나'라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시선의 부다아이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겸허해지곤 했다. 지은 죄가 있었다면 함부로 응시 할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 행여나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속내를 들킬까 두려워 나도 모르게 눈을 피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러할진대 상대는 부다아이가 아닌가.... ㅋ 내가 지은 죄가 많았던가... 왜 마주치기가 힘들지... ㅋㅋ
한국에서는 거리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원숭이를 쉬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유난히 원숭이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다. 몽키템플이라는 이름 답게 스투파 주변에도 원숭이들이 자기 집인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팔찌나 묵주,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목걸이를 파는 기념품 노점이 많았는데, 고르는 재미도 있고 흥정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탓에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말이 있지만 적당히 흥정만 하면 괜찮은 기념품을 GET할 수 있다. 기념품 노점이 많길래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놈들이 자기네들끼리 먹이 경쟁을 하는 것인지 세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싸움을 일으켜서 상인들 장사를 망치고 있더라. 인도원숭이에 비해서 좀 온순한 줄 알았는데, 으휴 원숭이 버릇 남 못준다더니.
아래로 내려가면 중앙의 스투파 뿐만 아니라 작지만 소박하게 생긴 스투파나 좌식 불상들이 자리하고 있다. 더군다나 스와얌부나트는 카트만두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방을 전망대 삼아 카트만두의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콸라룸푸르나 싱가포르의 마천루처럼 빌딩숲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에이~별 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낮아서 아름다운 소담한 매력도 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나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룽따를 볼 수 있다. 무엇을 그리 강하게 염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과한것 같으면서도 앤틱한 느낌을 주어 걷기엔 좋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카투만두의 시내를 벗어났다는 것이 기뻤던 것 같다.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던 세 개의 좌식 불상은 끝내 보지 못했다. 길을 못찾을 것이라고 겁을 먹었는지 조금 더 가보기가 무서웠고, 불상이 있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 밥을 먹는 것도 잊으며 걸었는데, 그때문에 굉장히 피곤했다. 다시 타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방에 들어와 낮잠을 푹~자고 나니 밖이 어둑어둑해졌다. 방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것이 아까워 밖으로 나서니 조금은 선선해져 돌아다니기 편할 정도였다. 찬 기운에 먼지도 가라앉아 공기도 꽤 맑았는데, 타멜의 상점들을 구경하기 딱 좋은 상태였다. 며칠을 돌아다니며 100% Silk나 100% Cashmere라는 문구가 정말인지 궁금했는데 찾아보니 역시나 거짓말들이라고. 캐시미어나 파시미나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싸도 너무 싸다 싶어서 귀를 의심하고 그들을 의심했다. 더군다나 캐시미어는 한국에서 몇 십 만원 단위를 호가하는 제품인데 이것들을 단 몇 백 루피(한화 15,000~20,000) 정도에 판매한다는 게 정말 웃기는 사실들이었다. 숙소 주인한테 물어보니 타멜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90%가짜라고 하니 말 다 했지 뭐. 싼 게 싼 값을 한다고, 나도 일회용으로 쓸 심산으로 100% 캐시미어 스카프(물론 거짓말이겠지만)를 속는 셈 치고 하나 구입했다. 가짜티가 팍팍 나긴 했지만 여행하는 내내 요긴하게 썼던 놈이다. 내일은 캐시미어 진품을 파는 곳을 찾아볼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