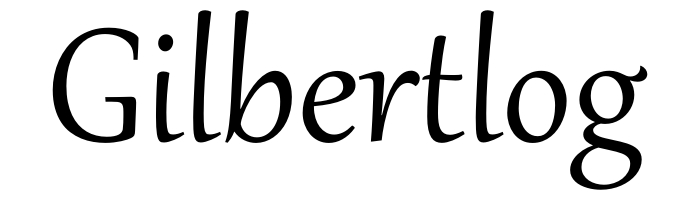

이곳을 결정한 건 바라나시 때문이었다.
많은 여행지 중에서도 이곳을 선택한 건 바라나시가 생각나서였다. 바라나시에는 온종일 운반되어 온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가 있는데, 화장을 하기 위한 의식을 행하고 시체를 태우는 장면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한국에서조차 화장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인도에 다녀온 이후로 잠시동안 윤회(輪廻)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는데, 시체를 태우는 것으로 하여금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다. 갠지스강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파슈파티나트를 선택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더 보고 더 느끼고 싶었다.

이른 아침부터 출발하지는 않았다. 다소 늦은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한 나는 쓸데없이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걷는 걸 선택했다. 유난히 걷는 걸 좋아하는 나이지만 그래도 화장터에 가는 걸 생각하면 마음을 단단히 정리하고 겸허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내 손에는 때묻은 지도 한 장, 그리고 50루피를 주고 산 라씨 한 잔이 있었다.

파슈파티나트까지 보통 300~350 NRP정도의 택시비를 부른다고 한다. 거리상으로는 공항보다 한참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워낙에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기에 택시기사들이 말도 안되는 가격을 부르는 탓이다. 초행길이라는 불리함을 안고 출발했기에 고난과 역경은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길눈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미로처럼 복잡해서 엉뚱한 길로 갔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인적이 드물어서 길을 찾는게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이 곳 사람들의 네비게이션은 제각각인지 경찰이나 군인에게 길을 물어도 잘 모르겠다거나 잘못 알려주는 게 태반이었다. 어찌보면 현지인들이 나에게 길을 묻는 게 이해는 간다.
그렇게 온종일을 걷는 동안 온몸이 먼지로 뒤덮여 쿨럭이는 걸 쉴 수 없었다. 거의 몇 초 간격으로 침을 뱉어야 했다. 길거리에 사람이며 오토바이, 자동차들이 어찌나 많은지 카트만두 생활이 4일이 넘다보니 낮은곳이라서 그렁저렁 지낸다는 생각보다는 소음과 매연에 대한 스트레스만 늘어 괴로웠다. 그래도 낯선 길과 집들을 수십 개나 지나치다보니 파슈파티나트에 닿았다. 그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덕분에 파슈파티나트에서 매일같이 행해지는 장례행사(화장)를 구경할 수 있었다.

파슈파티나트에 들어섰을 때 입구에서 관리인처럼 생긴 사람이 나에게 표를 살 것을 권했다. 파슈파티나트에서는 바라나시와는 달리 화장하는 것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표 값을 받는다 싶어 1,000루피나 되는 거금을 지불했다. 입구를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니 저렇게 생긴 사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힌두교만 들어갈 수 있단다. 나는 왜 1,000루피나 주고 입장권을 샀을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표 검사나 해달라며 속으로 아우성쳤지만 집에 가기 전까지 아무도 표를 검사하지 않았다ㅠㅠ

5시 였던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을 따라 다리를 건넜는데 비로소 화장터를 볼 수 있었다. 이곳을 가로지르는 강물은 바라나시의 갠지스강의 상류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의미가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이 죽고, 윤회의 의미에서 행하는 이 의식이 우리나라의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마는 사람이 죽는 것을 직접 보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가족의 슬픔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의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한 여름밤의 꿈처럼 잠깐 스쳐가는 것일 수 있지만 잠깐 스쳐가는 동안에 맺은 인연의 끈들은 만남이라는 기쁨과 이별이라는 슬픔을 동시에 남기고 가는 것 같다. 곁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은 잠깐이라도 혹은 평생 죽은 사람과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기에 슬퍼하는 것일거다. 아니라면 나처럼 울지 않고 멀뚱멀뚱 구경만 했겠지.

많은 사람들이 계단에 걸터앉거나 다리위에 서서 장례 장면을 보며 죽은 자의 남은 길을 함께 했다. 누구도 사소한 대화를 섞지 않았고, 그곳은 조용하고 숙연했으며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도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 네팔 사람들이 인도사람들처럼 윤회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장면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중요해보이지는 않았다. 누군가를 사랑하던,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일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의 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죽은자의 주검이 붉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 중에는 몇 몇이 애처롭게 울부짖던 곡소리도 있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이건 가이드 끼지 않은 게 아쉬웠다), 뭐 우리나라처럼 죽은자의 안녕을 빌어주는 거야 같을 거다. 그 곡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조금은 슬프다. 말이야 통하지 않아도 그 느낌이 절절하게 전해졌던 게 기억난다. 작년에 나를 두고 먼저 떠나신 외할머니 생각도 났다. 발인을 하고, 화장을 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살아생전 내게 해주시던 말씀, 나를 위해 차려주셨던 따뜻한 밥상, 90 평생 사시며 고생하느라 절벽의 계곡만큼이나 깊게 패인 손매듭 등등.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음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데, 그건 늘 떠난 후에야 알게 되더라. 참으로 사람 마음은 웃긴다.
인도의 바라나시 이후로 찾았던 파슈파티나트. 역시나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보러 오는 곳이기에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이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의미를 차치하면 죽어서 눈을 감는다는 슬픈 의미보다는 긴~ 꿈에서 깨어 눈을 뜬다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까. 그래서인지 바라나시와 파슈파티나트에서의 장례행사는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느꼈던 곳이다. 끝과 다시 시작이라는 것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