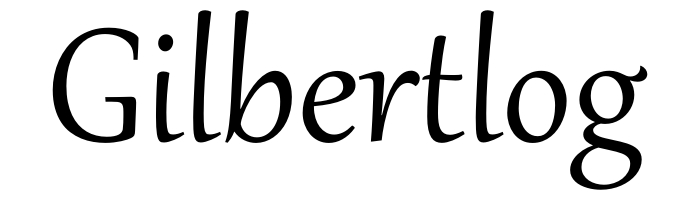
불교의 향기를 느끼다
유럽에서의 여행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봐야한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네팔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긴 일정에 적게 보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꽤 어려웠다. 여전히 '여행은 바빠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새벽에는 알 수 없는 조바심에 눈을 뜨고 분주한 사람들의 틈에 섞여 돌아다녀야만 할 것 같았다. 그래도 스스로와의 계획과 다짐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느린 아침을 먹고 억지로 게으름을 피웠다. 나와는 안 어울리고 성에 차지 않았지만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다. 어제는 파슈파티나트만 봤고, 오늘은 보다나트만 볼 생각이다.

매일 아침 먹는 건 잊지 않았다. 사실, 아침 먹는 게 가장 중요했다. 늦는다 할지라도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식사는 나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했다. 아침을 어디서 먹는 지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나는 숙소에서 불과 5분거리에 있던 Mitho라는 레스토랑에 매일 갔다. 그곳은 아침마다 늘 사람이 북적여서 내 입맛이 결코 배고픔으로 인한 착각이 아님을 알게 해준 곳이다. 이곳에서 계산을 맡고 있는 종업원 남자는 영어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청년이었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단번에 알아채고는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를 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는 그 청년은 매일같이 나에게 한국에 대한 질문을 하곤 했다. 한국에 가면 꼭 만나자며 연락처를 주기도 했다.
카트만두의 유명한 관광지에 갈 때 택시비를 흥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장점이다. 택시비를 흥정할 수 있다는 것은 택시 기사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더라도 유연하게 방어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가깝게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일종의 주도권을 잡는 셈이다. 마치 '나는 카트만두 내 모든 관광지의 거리와 택시비를 꿰고 있어'라고 어필하는 것과 같은 걸까. 때문에 숙소 주인, 여러 레스토랑의 종업원들, 심지어 사소한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넌지시 물어보곤 했다. 그래도 택시기사들끼리 암묵적으로 정해 놓은 정찰제가 있어서 그 선만 넘지 않으면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모든 관광지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나는 엽서나 사소한 기념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택시비를 조금만 아껴도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었다.
나는 운이 좋게도 보다나트에 170NRP에 올 수 있었는데(보통 250NRP를 부른다고 함), 택시기사에게 오늘은 손님이 넘치고 좋은일만 있을 것이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보다나트는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탓에 쉽게 찾을 수 있다. 입구에서부터 저 멀리 보이는 스투파를 보면 이곳이 보다나트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한가지 팁이지만 보다나트에는 입구가 여러개 있다.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들이 여러 방향에 위치한 입구에 내려주는 데 운이 좋다면(?) 입장료를 내지 않는 입구에 통할 수도 있다. 나의 택시기사는 매우 정직해서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곳에 정성스럽게 데려다 주었다(얼마 안하는 입장료이니 지불하는 걸 추천합니다). 보다나트는 스와얌부나트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규모가 더 큰 데다가 하얀색 석탑 위에 스투파가 올려진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더군다나 부다아이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특이한 매력이 있다(내가 여행을 다녀간 이후로 지진으로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어서 복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ㅠㅠ).

보다나트의 주변에는 상권도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고 스투파 주변으로 네 개의 사원이 있어 적은 입장료로 많은 것을 구경할 수 있다. 현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 오면 티벳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온 김에 시계방향으로, 그리고 오른손으로 마니차를 한 번 쭉 돌리고 사람들이나 기념품 등을 구경했다. 아, 그리고 하얀색의 석탑은 올라갈 수가 있었기에 다섯개의 색과 의미를 지닌 룽따를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뭐 이것들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괜찮다. 그저 오색으로만 칠해진 깃발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았다. 다섯 의미의 각기 다른 룽따에서 '다섯 개'나 모르는 일이 발생했지만 모르는 자의 여행 또한 매력이 있나니...(-_-)

네 개의 사원 중 한개에 들어가서 구경을 했다. 모두의 염원을 담은 초가 훈훈한 열기를 내며 타고 있었다. 이것들이 각각의 소망을 담은 촛불인지, 아니면 하나의 소망을 위한 여러개의 작은 촛불들인지는 잘 몰랐지만 얼굴이 익을만큼 뜨거웠다. 또한 현지 사람들은 무어라 중얼거리며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듯 하다. 안에는 수도승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경전을 외는 것 같다. 다들 한마음 한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수도승의 길은 어려운지 졸고 있는 사람도 보인다.

TV에서나 보던 티벳의 수도승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었지만 그들도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는지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다. 아주 평범하게 길을 걷거나, 아주 자연스럽게 상점에 들어가서 몸에 맞는 옷을 맞추고 아무렇게나 앉아서 이것저것 읽고 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욕심없고 소탈하게 사는 모습이 왠지 부러웠다. 마음의 짐이 없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맑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쓸데없이 멋져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들의 옷을 살까 상점 주변을 어슬렁 거리기도 한다. 내 머리는 무지 덥수룩했지만 말이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옴마니 반메홈(태조왕건에서 궁예가 늘 했던 명언!)'이 울려퍼지고 룽따들도 바람에 나부껴 멋대로 춤추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원들을 보았지만 종교가 없는 나로서는 한없이 낯설고 정말 일말의 감흥조차 없는 게 사실이지만 불교의 향기를 느껴보기엔 충분하다. 실제로 불교 신자들은 불교의 4대 성지 중 하나인 네팔을 성지순례의 명목으로 많이 찾는다. 부처의 탄생지인 네팔의 룸비니, 그리고 나머지는 인도에 있다. 내 계획에 룸비니도 있다. 내가 얼마만큼의 감동을 느낄지, 혹은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숙고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불교라는 색깔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내가 정말 힘들 때에 큰 존재로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한편으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부럽기도 하다. 나는 늘 자신만을 믿어왔으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던가. 버스 사진을 찍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 온통 난리통에 사진찍을 여유조차 없다. 보다나트 일정을 마치고 어영부영 꼼지락 거리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꼬맹이가 '타~~~멜, ^&#^$%#*%#'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얼떨결에 후줄근하게 생긴 로컬버스에 올라탔고 앞자리에 어떤 숙녀들 사이에 낑겨 앉았다. 버스에 탔던 사람들 중 네팔리안이 아닌 사람은 나뿐이었다. 시선이 단번에 집중되고 나의 물건 하나하나가 표적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조금 불편하기도 했다. 긴장한 덕분에 로컬버스를 처음 탔던 그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다. 시도때도 없이 목적지를 외쳐대는 꼬맹이와 그 작은 버스 안을 꽉꽉 채웠던 사람들, 그리고 뜬금없이 같이 탔던 꼬꼬닭 여러마리, 울퉁불퉁한 도로는 정말 REAL NEPAL이란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아직 네팔여행의 반의 반도 안했지만 불편한 게 오히려 기대가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매연과 바가지라는 새까만 가면을 쓴 카트만두를 벗어나서 트래킹의 천국인 포카라로 간다는 기대감 때문일까. 아니면 사랑과 낭만,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미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기대되기 때문일까. 이곳에 온 지 며칠 안되었지만 느끼는 게 참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