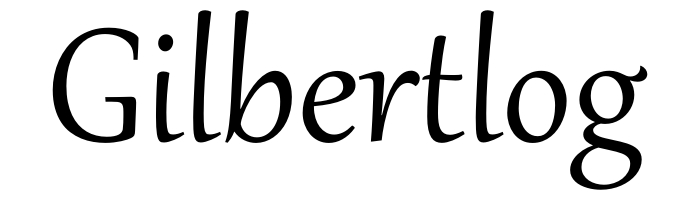
바라건데...(뭘?)
메이지 신궁에서 였을거다. 재미없고 고루할 것만 같은 사원을 소망과 미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해 준 자그마한 나무팻말.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 한국어로 쓰여진 이것을 걸어 놓는 것도 국위선양일까? 나는 무슨 소원을 적었을까. 그 시절 추억이 가득 담긴 사진첩을 뒤적여보니 '군대에 가기 전' 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아주 뜻깊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써 놓았더라. 이미 그 소원을 이루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무팻말에 적은 내용은 복선이 되어 나타났다. 아주 선명하게!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그는 쉴 틈이 없다. 매우 바쁜것처럼 보였지만, 음식을 다루는 자세는 고요하고 차분하다. 수백개의 접시가 식당의 한쪽 끝과 한쪽 끝을 줄지어 연결하고 있었다. 기다랗게 늘어진 생선들이 수줍게 웅크리고 있는 새하얀 쌀밥들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들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같았다. 갓 손질되어 나온 생선이 윤기를 발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접시를 비울 때마다 내 앞으로 오는 것들을 집어들어 내 앞으로 가져왔는데, 그 종류가 제각각이었다. 다양한 종류 덕분에 질릴 틈이 없었고, 입 안으로 풍기는 생선 저마다의 비릿함과 특유의 향 또한 인상적이었다.
신호등이 짠! 하고 켜지고 나면 그 곁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온다. 나도 한 무리가 되어 그 틈에 끼게 되었고, 오직 직선으로 걸어야 하는 목적있는 움직임 속에서 사방으로 산개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았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폭발하는 하나의 성운 같기도 하고 영화 '코어(Core)'에서 봤었던 맨틀 내부의 핵 폭발 장면 같았다. 사람들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서로를 의식했고, 행여나 나이드신 노인의 발걸음에 방해가 될까 그들을 배려하기도 하였다. 어느 무엇도 나를 괴롭히거나 채근하는 것은 없었다. 다만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할 지 고민이 되어 발걸음을 느리게 하였을 뿐.
워낙 오래전 일이라 박물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쨍쟁한 햇볕을 피할 틈이 없어 잠시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몸을 식힐까 들어간 곳이었다. 주변에는 꼬마 아이들이 많았다. 선생님처럼 보이는 사람을 졸졸 다라다니며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 선조들의 과거가 그토록 궁금한지 천진하게 웃으며 이것저것 묻는 모습들이 낯설었다. 박물관 구경은 재미없고 오래된 것들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미래로는 갈 수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거로는 갈 수 없다고 했다. 기분이 참 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