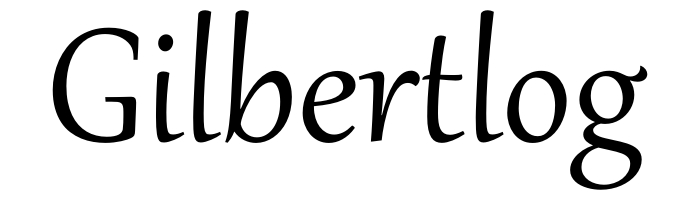
설산은 아침에 보아야 제 맛
꿈속에서 신라면을 먹다가 잠이 깨버렸다. 어제 저녁 라면을 먹을까 하다가 꾹 참았는데, 꿈에 나온 거다. 오늘만큼은 눈 덮힌 산을 보며 라면을 꼭 먹겠다고 아침부터 다짐했다. 가장 이른 아침에 일어난 나는 팬케익과 레몬생강차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유난히 한국사람을 좋아한다며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던 주인장 누나(?). 어제 나를 호객했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호의적이고 친절해서 편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음식이 맛있어서 오랫동안 있고 싶었던 곳이다.

누군가 설산은 아침에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참이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지만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중을 나갔다. 태양이 서서히 빛을 더하고 산 꼭대기가 반짝이면서 아래를 밝게 비추었다. 안나푸르나 트래킹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설산을 보며 걸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일거다. 기분이 무척 상쾌했다.

아직까지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인지 길이 넓고 바퀴자국도 보인다. 1,000m가 넘는 곳에 차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베이스캠프까지 차가 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찍 오기를 참으로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란드룩(Landruk)에서 뉴브릿지(New bridge), 지누(Jhinu)를 지나면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트래킹 코스가 인생의 청사진이라는 재미있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생각 같아서 혼자서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난다.

푼힐(Poonhill) 전망대를 통하지 않고 다른 구간을 선택했기에 생각보다 인적이 드물었다. 산 곳곳에 위치한 롯지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현지 사람들이 종종 보였는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마스떼'라고 인사하며 온갖 반가운 척을 했다. 아니, 정말 반가웠었다. 처음에는 인사하는 모양새가 어색해서 낯간지럽고 우습고 그랬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처음보는 사람과도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것이 이곳의 예의일수도 있지 않은가. 나는 하산할 때까지 나마스떼를 멈추지 않았다.

종종 아주 낡아서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다리도 몇 개 씩이나 지났는데, 아무리 겁이 없는 나라고 해도 이것을 건너는 것은 최고의 도전이었다. 한 다리를 내딛을 때마다 삐걱 거리는 소리가 났다. 철저하게 나무로만 만들어져 있는 바닥들은 그다지 촘촘하지 않아 바닥 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고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하필 영화 '실미도'에서 설경구를 필두로 한 그 대원들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생각났다. 원래 고소증이 없는데, 건너는 내내 정말 무서웠다. 밑에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는 강물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설산이라는 부모를 품고 있는 탓에 알 수 없는 근원지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왔는데 그 주변에는 항상 이름모를 꽃들도 있었다. 신발이 튼튼해서 축축한 건 신경쓰지 않아 가까이 가서 향기를 맡았다.

카메라의 타이머 기능을 알게 된 이후로 나는 혼자서 사진 찍는 것을 시도했는데 20장을 찍으면 겨우 한 장을 건질 정도였다. 갓돌무더기 위에 카메라를 끼우고(기스나는 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거리, 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아마 사진만 안 찍었으면 목적지에 한 시간 먼저 도착했을거다.

가끔 이런 깎아지를 듯한 절벽도 있다. 겨우 한 명만 지나갈 수 있을까 말까 했던 이 길은 가뜩이나 나무 다리 때문에 작아져 있던 나를 빈사 지경까지 몰아넣었다. '이런 절벽길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거니와 여행을 하기 전 있었던 라운딩 코스 사고 소식 때문에 더 아찔했던 것이다. 차라리 몰랐으면 편했을걸 그랬나. 근데 무슨 생각인지 사진을 찍어두었다. 무서운 걸 떠나서 정신이 나갔었나보다.

아까부터 나를 열 명 쯤 합쳐놓은 크기의 거대한 암석들 사이로 콸콸거리며 쏟아지는 에메랄드 빛의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는데, 드디어 가까이에 왔다. 현지 사람들에 의하면 이 다리가 뉴브릿지(New Bridge)와 지누(Jhinu)의 경계라고 했다. 나는 마치 국경을 건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건넜다.

지누(Jhinu)에 있었던 롯지 앞에서 잠깐 쉬었다. 다리가 피곤하기도 했고 마시던 물도 바닥이 났다. 트래킹 코스의 중간중간에 위치한 롯지에는 냉동 보관 된 음료수와 스낵, 그리고 물을 판매한다. 미네랄워터를 파는 구간은 지누(Jhinu) 이전에 이미 끝나버렸고(아마 물자 조달의 문제로 그러한 듯 하다) 여기부터는 석회가 포함된 물을 직접 정수한 여과수(Filtered water)를 몇 십 ~ 몇 백 루피에 수급받을 수 있다. 조금 미진한 감이 있었지만 갈증을 해소하기엔 충분했다. 여기서 쉬는 동안 몇몇의 트래커들이 이곳을 지났는데, 촘롱(Chhomrong)으로 향하는 사람과 지누(Jhinu)의 온천(Spa)으로 향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였다. 여기서 마주친 어떤 독일 남자 두 명은 그 쪽으로 향한다고 말하며 묵은 피로를 싹 풀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Spa'라는 단어가 그토록 유혹적인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가게 될 구간은 악마의 구간이라고 불리우는 지누(Jhinu) ~ 촘롱(Chhomrong) 구간이었기 때문이다. 여지껏 등산스틱을 가방에만 넣어두고 짐짝으로만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 놈들을 꺼냈다.

처음에 계단이 몇 개인지 셀 작정이었다. 가지런한 돌계단이 나오다가도 이따금 단순한 돌무더기들이 튀어나오곤 했는데, 중간쯤 와서부터 계단이 몇 개 인지 잊어버렸다. 땀으로 온몸이 흥건해지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다. 숨은 거칠어지고 몸은 힘들었지만 다행히 고산증은 오지 않았다. 내가 촘롱(Chhomrong)을 지나갈 때에는 전혀 춥지 않고 습도가 꽉 들어 찬 숨이 막힐듯한 더위가 엄습했는데, 그 때문인지 뒤를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던 것 같다. 게다가 아침에 너무 일찍 출발한 탓에 촘롱(Chhomrong)에는 너무 일찍 도착해버려서 촘롱(Chhomrong)을 지나 시누와(Sinuwa)까지 갈 생각에 힘들다고 투덜대는 건 사치라고 느껴졌다.

촘롱(Chhomrong)을 지나다 보면 물자를 실어나르는 당나귀나 말의 행렬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각또각 소리가 들리기 이전에 짤랑거리는 새침한 종소리가 먼저 들리는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좁다면 계속해서 걷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놈들은 앞으로 걷기만 할 뿐, 트래킹 코스에 대한 배려는 없는 편이다. 한 여행자의 말로는 음악을 들으며 바깥쪽에서 걷고 있던 트래커가 종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떠밀려 추락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촘롱(Chhomrong)부터 베이스캠프(ABC)까지 가는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갑자기 트래커들이 늘었다. 나처럼 페디(Phedi)에서 시작한 트래커들 소수와 나야 풀(Naya pool)에서 시작한 다수가 이곳에서 만난다. 중간지점이라 그런지 다른곳에 비해 롯지도 많고 괜찮은 베이커리나 레스토랑, 기념품 샵이 많이 있다. 촘롱에 도착해서 2,000m가 넘는 고지의 정점에 왔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는데, 맙소사... 내리막 길이다. 올라온 만큼 다시 내려가야 해서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다리를 다잡을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촘롱(Chhomrong)을 아우르는 구간은 유난히 계단이 많았는데, 계단의 곳곳에는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자칫 밟을 수 있는 말똥들이 많았다. 계단에 말똥들이 어찌나 많던지 까치발을 세워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곳도 많았다. 오래되서 지푸라기의 색으로 위장하고 있는 놈, 방금 나와서 연기가 폴폴 나는 놈들도 있었다. 덕분이라는 단어를 쓰기 민망하지만 '덕분'에 다리에 긴장을 풀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다.

오르고 내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잡힐듯이 가까이 있는 설산을 두고 좀처럼 쉴 수가 없었다. 촘롱(Chhomrong)에서는 저렇게 날카롭게 생긴 봉우리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놈의 이름은 마차푸차레(Machapuchare)1였는데 안나푸르나 트래킹을 하면서 가장 멋지게 생긴놈이었다. 7,000m에 육박하는 저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누와(Sinuwa)에 가까워지니 촘롱(Chhomrong)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지나올 때에는 꽤 컸던 마을이 이제는 사진속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다. 저기에는 유난히 아늑하고 깊은 냄새를 풍기던 빵집이 있었는데, 하산할 때 꼭 들르기로 다짐했다. 촘롱(Chhomrong)에서는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는데 목적지에 다다르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시누와(Sinuwa)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다. 도착하자마자 방을 잡고, 점심식사를 주문하여 야외의 식탁에 앉았다. 멈추고나니 비로소 바람이 느껴져 땀에 절어있는 몸을 말렸다. 요리를 해 준 주인 여자는 보통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묵지 않는다며 아침에 어디에서 출발했냐고 나에게 물었는데, 란드룩(Landruk)에서 출발했다고 하자 나에게 강철다리를 가졌다며 칭찬일색이었다. 내일은 데우랄리(Deurali)까지 갈 것이라고 말하자 지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ㅋㅋ
여기부터는 전기와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돈을 지불해야 했다. 네팔의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싸다고는 해도 배낭여행객인 나에게 있어서 단 돈 10NRP도 굉장히 큰 돈이었다. 와이파이와 핸드폰 충전을 포기하면서 마음은 편해졌다. 늘 귀찮다귀찮다 하면서 억지로 붙들고 억지로 연락을 기다리고 궁금하지도 않은 네이버 뉴스기사를 읽기 위한 수단을 포기하니 자연과 조금 더 가까워 졌다고 해야 하나.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유난히 서둘렀던 탓인지 오늘은 가방이 더 무겁게 느껴졌었다. 카트만두 첫 날 옷을 두 개나 버리고, 포카라 첫 날에도 옷을 하나 더 버렸다. 배낭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여행을 하며 사고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도 많이 사며 이것저것 챙기다보니 오히려 더 무거워져 버렸다. 여행을 하기 전 '짐의 무게가 욕심의 무게다'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시작했지만, 아직 그대로였다. 내 마음을 비워내기에는 아직 사서 고생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더 해야 함을 느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