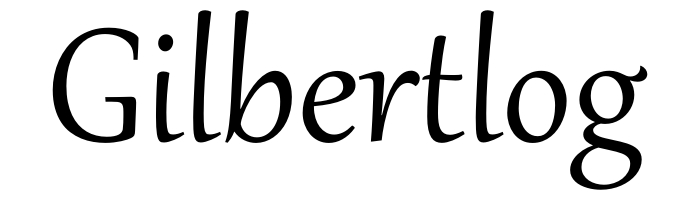
새로운 도전
어찌나 깊은 잠을 잤는지 머리맡이 차가워지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트래킹을 하며 며칠 내내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곤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알람소리를 듣고서야 잠기운을 씻어낼 수 있었다. 어제 숙소에서 만난 한국인 트래커들과 따뜻한 난로 앞에 모여앉아 즐거운 아침 식사를 하고 마차푸차레(Machapuchare)가 보이는 벤치에 걸터앉아 아침 일출을 지켜보았다. 따다빠니(Tadapani)에서 내려다보는 일출은 무엇보다도 운해(雲海)가 인상적이었는데, 쌓인 피로가 싹 가실만큼 멋지더라. 이것을 배경으로 안나푸르나에서의 의미있는 첫 단체사진을 찍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일정을 파괴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나의 원래 일정은 이랬다. 따다빠니(Tadapani)에서 데우랄리(Deurali), 고레빠니(Ghorepani) 순으로 내려갈 생각이었지만 이 지도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 남들이 좀처럼 가지 않는 루트를 가보고 싶었던 것. 지도 옆에 부연설명으로 있었던 문구들이 나를 유혹했다.
You can see altogether 25 mountains.
단순히 이 한 문장만을 보고 길을 바꾸기로 다짐했다.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루트이기에 동행을 구하기란 힘들었고, 트래커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길이라 어떻게 보면 위험한 코스이기도 했지만, 3,700m의 높은 고도에서 25여개가 되는 안나푸르나의 모든 봉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모험심이 발동한 것이다. 가이드도 없고, 포터도 고용하지 않은 다소 위험한 트래킹에 '도전'과 '호기심'이라는 위험 요소가 더해졌다. 하지만 무척 흥분되고 떨렸다.

무심코 이 길을 택하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이 닿질 않아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쉬이 들렸고 각각의 소리가 의미를 더하기 시작했다.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다. 어제, 엊그제 보았던 대자연의 아름다움도 까맣게 잊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올라가는 내내 혼자여서 그런지 가는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에 의미를 더하는 것은 더더욱 쉬웠다.

굳이 문제를 꼽자면 사람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라 길이 나 있을리 만무했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나뭇잎을 헤치며 걸어야 했다. 지도가 없기에 사람들이 표시해 놓은 저 흔적들에 의지해야 했다. 길에 풀어져 있는 실타래를 따라가는 꼬마아이처럼 천진하게 걸었다. 저 흔적이 어디 있나 이 나무 저 나무를 살피고 돌맹이를 살피곤 했다. 보물찾기 하는 재미가 있다. 중간에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는데, 까만색 야크들이 풀을 뜯고 있는 곳을 따라갔다.

도바토까지 가는 길은 그리 험하지 않았다. 다만, 어제 마신 맥주가 독이 되었는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고, 탈수증세까지 오기 시작했다. 물도 충분하게 채워오지 않았는데, 심지어 2시간을 오르는 동안 롯지 하나 보이지 않았다. 서늘은 습지를 벗어나면서 건조한 고원이 나오기 시작했고 갈증은 극에 달했다. 50여분을 더 올라가니 메사르(Mesar)라는 롯지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으.....'라는 신음소리만 꽥꽥 지르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1시간 정도를 더 올라갔다. 인적이 이토록 드물줄은 몰랐는데, 올라가는 내내 단 한명도 마주하지 못해서 물을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아침식사를 토스트 두 조각과 밀크티 한 잔으로 해결했는데, 갈증에 배고픔까지 더해지기 시작했다.

이곳은 이사루(Isharu). 땅만 쳐다보며 올라가고 있었는데, 뚝딱거리는 못질 소리가 들려 위를 쳐다보니 장정 두 명이 롯지를 손보고 있었다. '드디어 사람이다'하며 너무 반가운 마음에 도착하기 한참 밑에서 '나!마!스!떼!'라고 외쳤더니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가방을 던져버리고 식탁에 앉아서 주린 배를 만지작 거리면서 배고프다고 말했다. 네팔에 온 이후로 누들수프가 맛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기에 메뉴판을 보고 할것도 없이 누들수프를 주문했다.

식탁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운해를 바라보며 먹는 누들수프의 맛이란. 운해의 웅장함은 뿔고있는 라면의 맛도 잊게 만든다. 비행기 탈 때나, 오직 TV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운해가 내 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퐁~당 하고 빠져보고 싶은 곳이다.

태양이 높아지면서 구름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과연 오늘 내로 이 확정없는 여정을 끝낼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운해는 마치 밀물처럼 밀려들면서 작은 산들부터 잠식해가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무서워질 정도. 그래도 셀카는 잊지 않았다.

서서히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산줄기의 갈빛 고원을 넘으며 한겨울의 말보로 사운드(Marlborough Sound; Newzeland)가 생각났다. 황금색 지푸라기들이 바람의 나부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곳이 3,000m가 넘는 곳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조용하고 쓸쓸함이 가득했다.

고개를 하나 넘어 도바토(Dobato)로 가는 길은 정말 조용하고 한적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다. 고도가 3,400m에 접어들면서 물이 흐르는 소리도 멈추고 새들이 우는 소리도 사라져갔다. 황무지에 내던져진 아이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흔한 낙엽조차 없어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도 없었다. 내 거칠어진 숨소리만 이 고요함을 깨고 있었다. 이름 모를 꽃을 발견했을 때 쯤(위의 사진) 도바토(Dobato)에 도착했다. 한 젊은 네팔 여자가 나를 반겼다. 아마도 내가 오늘 첫 손님인 듯 했다.

도바토(Dobato)의 숙소는 하룻밤 300NRP였다. 방값이 그닥 착하지는 않았지만 숙소 주인이 너무 싹싹하게 맞이해주어 그돈이 아깝진 않았다. 다만 방값이 비싸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줄었다는 것 빼면 다 좋았다. 숙소 바로 앞으로 펼쳐진 안나푸르나의 여러 봉들의 정기를 듬뿍 받아 먹는 것으로 퉁.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어느덧 오후 4시. 다이닝 룸에 홀로 앉아 조용히 일기를 쓰며 밖의 전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주인여자가 오더니 말을 걸었다. 내일은 뭐 할거냐, 어디로 갈거냐 등등. 주인여자가 자신의 핸드폰에 담겨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번에 새로 열린 안나푸르나 에코트랙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는데, 충분히 가볼만 했다. 털옷을 두른 야크가 호수 주변을 거닐며 풀을 뜯는 모습이나 널따란 산맥을 두르고 있는 호수의 모습은 보기 힘든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튼튼하게 계획은 세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가지 못했다. 아마 이 날부터 다리가 말썽이었던 것 같다.
데우랄리(Deurali; 3,200m) 이후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잠을 청하는 첫 날이었는데, 상당히 추웠다. 낮잠을 잤던 탓에 밤잠을 이루기란 쉽지 않았고, 밖에서 사진을 찍자니 손이 아플 정도로 추워 으덜덜덜 소리를 내며 다시 기어 들어왔다. 다시 다이닝룸으로 왔을 때 트래커 두 명이 이 곳을 찾았다. 그들은 네팔리안 형제였는데,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유학파(?) 친구들이었다. 호주생활을 하는 동생 패트릭(Patrik)과 카트만두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형 수니르(Sunir)는 여태 살면서 네팔 트래킹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영어 실력은 내 영어가 초라해질 정도였다. 뉴질랜드와 유럽여행을 주제삼아 대화하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여행담은 좋아하니까). 오히려 한국 드라마나 음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이기에 이야기 하는 것이 더 편했다. 올드보이나 김남복 살인사건의 전말, 꽃보다 남자 등등 온갖 장르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정도? 늦은 밤까지 다이닝 룸 한가운데에 있는 난로 앞에 둘러 앉아 따뜻함을 나누며 한참을 이야기 했던 것 같다. 뉴질랜드 이후로 난로 앞에 앉아서 불을 쪼이는 것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뜨뜻하게 익어가는 내 엉덩이의 나른함에 녹아 '으아~'를 연발했던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