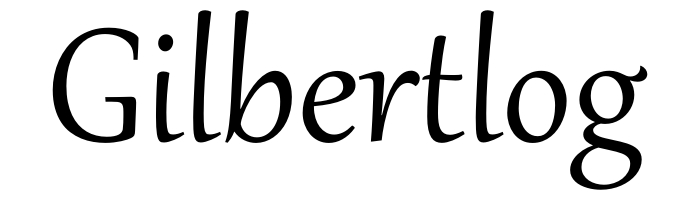
좀 쉬어가기, 더 천천히
Osaka -> Kyoto
아침이 우중충했던 기억이 난다. 덥고 습했던 어제와는 달리 금방이라도 쏟아낼 것처럼 우중충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마음만 앞서있었는지 몸이 좀 으슬으슬한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잠들기전에 마셨던 맥주와 편의점 도시락이 소화가 안되었는지 속도 구리구리했다. 평소같았으면 아주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며 계획한 대로 교통편을 살피고 있었어야 했지만, 오늘은 그냥 쉬어가기로 했다. '일본에 왔으면 일본다움을 좀 즐겨야겠지?' 하면서 지하에 있는 온천에 몸부터 담갔다.
어릴적부터 동물을 보고 만지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많았다. 대학생이 되고서 처음 갔었던 코엑스의 아쿠아리움에서 어린아이들의 틈에 끼어 '우와!!'를 연발했던 기억이 난다. 오늘은 결코 그러한 주책을 부리지 않는다고 다짐을 하고서 들어갔다.
 |
 |
입구에는 돔 형식의 수족관이 있었는데, 상어들이 워낙에 민첩한데다가 조명이 어두워서 카메라에 제대로 담지 못했다. 길을따라 조금 걸어 나와서야 사진을 겨우 찍을 수 있었는데, 사육사들이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바다표범은 본래 생긴것에 비해 포악하다고 하는데 동물원에서 나고 자랐는지 얌전하게 먹이를 받아먹는다. 펭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귀여움을 사정없이 연발했다. 펭귄은 조건만 맞으면 키우고 싶을 정도로 귀여웠다.
 |
 |
 |
아쿠아리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좀처럼 내부구조가 짐작이 가지 않았는데, 중앙에 있는 수족관에 오니 대충 그 생김새를 알 수 있었다. 수족관은 처음 입장할 때 기다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장 꼭대기 층으로 올라온 후에,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구조이다. 가운데 커다란 메인수조에는 카이유칸 수족관의 간판스타인 고래상어가 유유자적하고 있고 나의 키정도 되보이는 가오리도 수조를 이리저리 휘젓으며 헤엄치고 있다. 메인 수조를 빙 두르며 구경하는 재미가 나름 쏠쏠하다. 생각보다 꽤 크다.
동생과 독일 뮌헨의 거리를 걸을 때, 우스갯소리로 '우리, 여기서 오징어가 된 기분이야'라고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뮌헨의 거리를 모델처럼 활보하던 독일 남자들의 외모와 키에 감동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 했었다지. 오징어가 그래도 꽤 생겼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런 주제넘는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미안하다 오징어야.
지나가다가 우연히 왼쪽을 바라보았는데, 혼자 물구나무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던 바다표범. 가까이서 손짓하는 꼬마아이의 동작에 맞추어서 인사를 하고 있었다.
 |
 |
 |
 |
 |
바다 생물중에 특히 좋아하는 게 있다면 해파리인데, 유난히 예쁘게 생겼다. 물의 흐름에 맞추는 것인지 자기가 움직이고 싶을때만 움직이는 것이 더 매력적.
다행히 비는 안오고 있었다. 아쿠아리움의 기념품샵에는 나의 주의를 끌만한 대단한 기념품이 없었는데, 여행이랍시고 버릇처럼 충동구매를 해버렸다. 고래상어가 들어가 있는 입체 무늬의 클리어홀더를 하나 샀다. 무슨 쓸모가 있겠냐마는 이 곳에서 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버리고는 기분좋게 오사카 스테이션으로 향했다.
오사카 스테이션의 명물(名物), 'Waterfall clock'. 분 단위로 시간을 알려주면서 각기 다른 모션을 보여준다. 개중에는 여러나라 말로 인사하는 인사말들이 있었는데 물론 '안녕하세요'도 있다. 보는 내내 신기해서 꼬마아이들처럼 가까이서 물이 내려오는 입구를 살펴보기도 하고 점묘를 보듯이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였다. 배가 고픈줄도 모르고 시계만 쳐다봤던 기억이 난다.
어렵게 한큐스테이션 라인을 찾아서 도착한 교토인데, 처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교토의 이미지와 많이 달랐다. '교토'라고 함은 조용함과 포근함, 그리고 온유함의 온상이었는데(나에게), 생각보다 빌딩도 많고 자동차도 많았다.
무슨 날인가 싶어서 야사카 신사(八坂神社)으로 조금 더 걸어보기로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모르는 행렬이 기온 시죠를 초입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나이가 제법 지긋해 보이는 분들의 팻말에는 'I don't want to war'였는데, 당시 시사 이슈 중 하나였던 아베의 전쟁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 행렬로 보였다. 알기론 일본의 시위문화는 다소 조용하고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알고있었는데,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표출하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게 조금은 신선했다. 전쟁 법안이 상당히 민감한 소재라는 것을 느꼈다.
기온 시죠 쪽은 잘 알려진 것처럼 구경할 만한 볼거리가 참 많다. 디저트가 유명한 카페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백화점에는 사람이 넘쳐난다. 지하철 역이나 버스 정류장을 지날 적이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걸 볼 수 있다. 좀 익숙하다 싶었는데, 예전에 뉴질랜드의 거리와 분위기가 좀 비슷했다. 위에 천장이 있어서 그런가?
맞아... 내가 교토에 오면서 제일 기대했던 모습이 이거였는데, 드디어 찾았다. 다리를 건너고 나서야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인데, 무심한 듯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레스토랑의 테라스가 정말 인상적이었었다. 다리 아래로 소리 없이 강물이 흐르고 여행객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흔한 일본의 풍경인가 이게.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생각해보니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었다. 안그래도 일본 전역에서 교토를 찾는 사람이 다소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었는지도 모른다. 배낭은 무겁지, 날씨는 구리구리해서 삭신이 쑤시지... 때문에 조금 더 시골같은 조용함과 평화로움을 원했었는데, 산만한 느낌이 다분했다. 게다가 숙소를 찾려고 걷고 있는 도중에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나 우산 안가지고 왔는데...
찾아 들어간 숙소에서 '이 곳은 예약하신 숙소가 아니라 기온 시죠 점 분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생각해 두었던 계획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챙겨온 우산을 펼쳐들기 시작했고 빗줄기가 조용하게 떨어지는 숙소(분점ㅠㅠ)의 처마 끝에 앉아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자리를 옮겨 내가 예약한 숙소로 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숙소를 찾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단순히 직선 도로를 타고 가면 되는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꽤 있어서 긴가민가했던 때문일거다. 덕분에 교토의 분위기를 방방곳곳 느껴볼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게 빗줄기가 꽤나 굵었기 때문이다. 두 손으로 머리와 눈가를 가리고 뚜벅뚜벅 강변을 걷는 모습이 약간은 처량해 보일 정도였다. 저녁을 먹을때 즈음해서야 겨우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날 숙소에서 만난 한국인과 교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교토스테이션 쪽으로 걸었고, 덕분에 심심할 뻔 했던 교토에서의 첫번째 밤을 조금은 알차게 보냈다. 비를 잔뜩 맞았음에도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는 '비오는 날의 교토'를 그토록 원했기 때문일까. 오늘은 쉬어가기로 계획했던 날인데, 본의아니게 강행군에, 훈련을 받은 것 같은 하루였다. 내일은 좀 더 낫겠지.
씻고, 숙소 2층 침대에 몸을 뉘였을 때, 천둥이 치고 비가 창문을 수도 없이 두드렸는데도 잠이 금세 들어버렸다. 내일이 빨리 오길 기대해서일까. 교토가 좋아지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