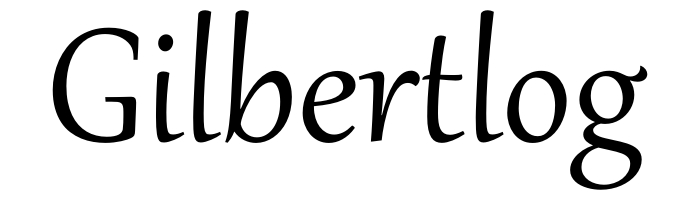
약속 없는 주말이 너무 좋다.
기억하고 싶은 일요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안해도 되고, 스스로에게 가기 싫은 약속장소에 대한 강요도 하지 않아서 좋다.
주말의 게으른 아침을 일찍 깨우는 수고로움도 없고, 느지막이 일어나 시계를 보고 놀랄 필요도 없다.
이토록 아름다운 한가한 주말의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지난 일주일 간 내가 살피지 못한 것들을 꼼꼼하게 바라본다.
침대 프레임에 앉은 먼지나, 조금 풀이 죽어있는 화분, 비우지 않은 쓰레기통, 가지런하지 못한 신발.
계획되거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는 중에 주전자에 물을 한가득 담아내고, 소리가 날 때까지 푹 끓인다.
마침내 그 물을 미리 풀어 놓은 인스턴트 커피 잔에 담아내면,
커피의 진한 향이 방에 퍼지기 시작하고, 멋진 주말의 아침이 일부 완성된다.
이 아침을 너무나 기억하고 싶다.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쓰지 않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 버렸다. 그동안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꽤 있었다.
내 언어로 좀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장면들도 몇 있었다. 아름답다고 해서 꼭 예쁘거나 멋진 것은 아니었다.
오늘처럼 황홀하게 아름다운 아침의 햇빛,
귀까지 덮는 털모자를 눌러쓰고 안아달라고 손을 하늘로 뻗치는 꼬마아이의 손가락,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와 덤덤하게 산책하는 사람들,
모래사장에 짧은 소리를 내며 들이치는 파도,
바닷가에 나란히 서서 타이머를 누르며 뛰어가는 사람들
이를테면, 이런 것들 말이다.
그럴 때마다 노트나 일기장에 적어서 기억해 둬야지 하는 욕심보다는,
귀찮아서 뒤로 미루다가 까먹어 버리거나, 나의 글쓰기 솜씨를 의심하며 '이걸 굳이 글로 써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것들을 망설인 적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나만의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언어를 쓰고 싶지만, 나만의 언어로 그것들을 말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과 표현으로 그 장면과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왜 글로 써야 할까 라는 의심을 계속 하면서도, 계속 쓰고, 글을 다듬고,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공백을 조금씩 채워나간다.
내가 느끼는 것을 설명하려 할수록 실체와 멀어지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풀어내려 할수록 진심과 멀어지는 걸 느낀다.
명확하게 전달하려 할수록 흐릿해지거나, 그렇게 써 내려간 것들이 수치심이나 바보같은 기억들로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써 버리는 순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슬퍼질 때가 있어서, 때로는 글쓰기를 멈추고 그냥 두는 것들이 늘어 간다.
예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고민했지만,
요즘은 내가 쓰는 글로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쉼표는 어디에 찍고 온점은 어디에 찍어야 할지,
지금 이 말을 뱉어낼 때인지, 아니면 삼켜야 할 때인지를 고민한다.
SNS에 올라오는 입이 벌어질 정도의 탐스러운 음식 사진들이나
꽤 괜찮은 몸매를 과시하는 사진들은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기억력 주기'를 점점 짧아지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한 장의 가족사진을 가슴에 품고 고향의 냄새와 가족과의 추억을 되새김질하는 전쟁 군인의 기억과
수 많은 음식이나 셀카 사진을 보면서 기억하는 순간의 기억들을 어떻게 비견할 수 있을까.
나는 좀 더 의미있는 사진을 찍고 싶고, 과묵한 글을 쓰고 싶다.
모호하고 과묵한, 나만의 언어를 가지고 싶다.
방 안에 햇빛이 들이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