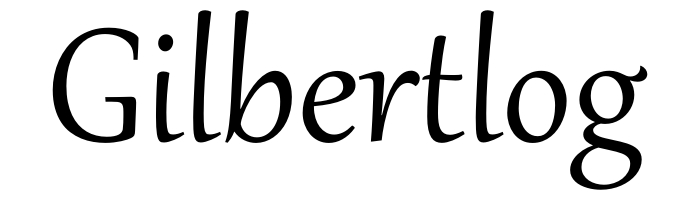
카자흐스탄 여행은 원래 계획에 없었다. 단지 내 욕심의 무게를 확인하기 위한 배낭만 하나 챙긴 채 원래는 조지아 여행에 포커스를 맞추어 여행을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트빌리시 직항이 없었음에 한편으로 감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가을은 꽤 괜찮았기 때문에.
2018년 9월 23일 토요일, 인천공항에서 약 7시간이 걸려서야 알마티 국제 공항에 도착했다. 환전과 동시에 출구 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멍청한 이방인을 찾는 하이에나들이 먹이를 기다렸다는 듯 나에게 달려들기 시작한다. 물론, 그런 수작에 넘어갈 내가 아니다. 이미 현지 가이드로부터 호텔까지의 택시비가 3,000탱게라는 걸 알고 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름 속아주겠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4,000탱게를 불렀다. 그랬더니 역시나 택시기사들은 5,000탱게로 흥정하기 시작한다. 얄짤없어. 외국인들을 통해서 한탕 해먹겠다는 택시기사들의 사기꾼 근성은 어느 나라건 똑같은 것 같다.
첫날의 계획은 없었다. 짐을 풀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아무 생각없이 밖을 나섰다.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가 낮은 채도의 색들이 줄지어 있어서 그랬는지, 조금 삭막한 느낌을 받았다. 나를 제외하고는 동북아시아 출신의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고, 사람들 무리를 지나갈 때마다 낯선 시선을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야 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온 건데, '와 저거 특이하게 생긴 사람이다'라는 카자흐스탄 사람의 특별한 경험에 한 몫 한 것 같았다.
우연히 Green Market을 지나쳤다. 어느 곳을 여행하던지 시장가의 분위기는 좋다. 이름처럼 과일과 채소를 잔뜩 가져다 놓고 도매가로 파는 곳 같았다. 후드티와 베스트를 입었던 탓에 이곳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토마토나 바나나를 사서 먹어볼까 하다가 나름 여행의 첫날에는 근사한 저녁을 먹고 싶어 주린 배를 아껴두기로 했다.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한국말로 쓰여진 매운 컵라면을 발견했는데, 이 날 사지 못한 걸 여행이 끝날때까지 후회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2주 동안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정말 고통스러웠다.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었던 도로. 솔직히 낙후된 오프로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리가 멀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외제차도 종종 보였다.
이곳도 가을이 무성하다. 군데군데 잘 익은 나무들이 보인다. 기분이 좋을 정도로 한국/중국사람들이 안보여서 기분은 괜찮았다.
가을이 하나의 '질문' 이라면, 그 답은 낙엽과 벤치와 음악일 듯 하다. 사진을 보고도 가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가을이라는 계절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여자의 외모에 집중하는 것 둘 중 하나 일 듯 하다. 도촬한 분께는 죄송... 사실 가을에 집중했던 건 아니고 마트에 들러서 치즈 비슷한 걸 샀는데(도무지 읽을 수 없는 언어라서 이게 치즈인지 뭔지도 몰랐다), 왠만한거는 다 먹는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 때문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ㅠㅠ
곧장 숙소 1층에 있는 식당으로 와서 주문을 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찾지 않는 T-bone 스테이크와 어느 나라 어느 식당에 가던 머쉬룸 스프의 맛이 궁금한 나를 위해서 이것도 시키고
거기에 하루를 잠재울 시원한 생맥주까지. 여행 첫날의 저녁이 완벽했다. 영어를 어줍잖게 하는 종업원이 꾸역꾸역 주문을 잘 받아 틀린거 하나 없이 갖다 주었다. 이렇게 잔뜩 시켰는데도 5,000탱게(한화 15,000정도)가 나왔는데, 기분이 좋아서 종업원에게 팁까지 줬더니 '쓰빠씨바'라고 말해주었다. 러시아어로 고맙다는 말인데, 알고 있었음에도 아직까진 욕으로만 들려서 익숙하진 않았다^^;
첫날이 이렇게 지고 있었다. 첫날 느낀점이 있다면, 비행거리가 꽤 길었다는 점,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 물가가 무지무지 싸서 200$ 환전한 걸 후회했다는 점, 한국 라면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점, 그리고 와이파이가 제일 잘 되었던 날이 오늘이었다는 점.
그렇게 여행의 하루가 조용히 잠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