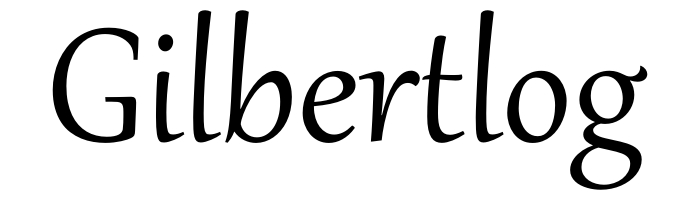

어제 불같이 돌아다니고 불같이 잠들어서 새벽 이른시간에 눈이 저절로 떠졌다. 회사다니면 맨날 늦잠자고 싶은데, 여행에서의 잠은 1분 1초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건 나만의 국룰... 눈뜨자마자 밖을 나섰는데, 아직 안녕을 고하지 않은 새벽 별빛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어제 그 자리에 있던 별들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시골집의 흔한 아침풍경인데,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 닭이 울고 개가 짖고 굴뚝에는 연기도 피어오른다. 흡사 우리나라 시골이라 해도 믿을 법한 모습들이었다.

이제 아침이 가까워지고 들이치는 햇빛을 맞으며 홍차 한 잔 하기.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대자연 카테고리인 '호수'를 방문하는 날인데,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다. 거점 마을인 사티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면 카인디 호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콜사이 호수가 있었다. 콜사이 호수를 마지막으로 알마티로 이동할 예정이라 카인디 호수를 먼저 가기로 했다. 사실 카인디 호수는 콜사이 호수 국립공원의 많은 호수들 중 하나이다.

오늘의 첫 여행지인 케인디 호수에 가기 위해 이전에 길동무가 되어 주었던 도요타 봉고를 뒤로하고 미츠비시의 4륜 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아침 산공기는 매우 쌀쌀해서 들판위에는 서리가 잔뜩 서려 있었다.
조금 더 이동하니 원래의 길은 없어지고 강물만 졸졸 흐르고 있어 어떻게 가려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지 하는 마인드로 가로질러 가기 시작 ㅋㅋㅋ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가로질러 간다


산 중턱쯤? 올라오니 이렇게 중간중간 캠핑을 하는 사람들도 좀 보였고, 어제 봤었던 유르트도 보였다.

드디어 도착한 카인디 호수. 산 중턱즈음을 올라왔다가 다시 한 2~3분여 정도 내려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밀의 숲을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호수는 투명하여 속이 다 비치고 녹색 이끼와 파란빛이 섞여 오묘한 빛을 내고 있었다.


카인디 호수는 1910년도에 규모 10의 지진때문에 계곡이 매몰되어 생긴 호수라고 한다. 지진의 영향으로 고인 차가운 물 때문에 그곳에 서 있던 나무들이 죽어버렸고, 그대로 썩지않고 석화하여 저렇게 우뚝 솟은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호수의 물은 조금씩 줄고 있어서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일찍 잘 온거겠지?


수평은 이렇게 맞춰주고, 내가 이쪽에 위치하게 해줘라고 주문만 하니 이런 아주 멋있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어주었다. 사진 속에 케인디 호수와 가을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다.




호수 뒷편으로 좀 더 들어가면 호수의 원천이 되는 곳으로 걸어들어갈 수 있다. 처음에는 들리지 않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협곡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곳은 아직 아침이 덜 깬 것인지 나뭇잎에 서릿발이 내려앉아 있었고, 가을답지 않게 초겨울처럼 쌀쌀했다.

다시 숙소쪽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차를 도요타 봉고로 갈아타고, 이번에는 콜사이 호수(Lake Kolsai)로 갈 예정이다. 오는 길은 가을이 진하게 무르익었었는데, 노란빛이 참 아름다웠다.


숙소에 가기 전 언덕에 잠시 내려 마을을 바라보았다. 강의 물줄기가 흩어져 특이한 장면을 연출해 냈다.


콜사이에 있는 호수 중 가장 길고 큰 호수에 도착했다. 이곳은 해발 1,870m에 위치하고 있고 총 길이가 1km정도가 되는 생각보다 꽤 넓은 호수이다. 호수를 빙 둘러 전나무와 소나무들이 가시처럼 솟아있고, 군데군데 노란빛을 내는 이름모를 나무들도 위치해 있었다.

호수를 빙 둘러 걸어볼 수 있는 트래킹 코스가 간단하게 있어서 조금만 걸어보기로 한다. 가파른 절벽길이나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코스였다. 호수 언저리에는 물고기도 헤엄치고 있었다.



트래킹하다가 인스타감성 폭발하는 데크 발견. 여기서 사진 엄청나게 찍었다. 혼자서 타이머 맞춰두고 어찌나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지... 여행을 다녀와서 내가찍은 사진만 봐도 행복하다는 게 이런 것 같다. 글을 쓰며 사진을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이 순간에도 이 사진만 보면 정말 배부르고 행복하다.

이땐 되게 날씬했었네...

마지막 행선지니 만큼 같이 사진을 찍자 하니 흔쾌히 응해준 타냐와 로만(일단, 아침 식전머리에 팁을 두둑하게 챙겨주었음. 자본주의 미소로 추정됨).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에 능한 타냐는 부모님이 러시아 사람이라고 했고, 로만 또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러시아인, 어머니가 카자흐 사람이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분위기나 느낌만 봐도 아시아와 서방의 경계?에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타냐와 로만을 보니 그 느낌이 더해졌던 것 같다. 외모는 러시아인에 더 가까운데, 카자흐스탄 국민이라고 하니, 뭔가 생소하고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그랬나보다. 인종에 대한 편견은 전혀 없으나, 뭔가 새로웠다.

카자흐스탄의 길고도 짧은 투어가 끝났다. 뭔가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갈만한 곳도 많고 할 수 있는것도 충분히 많음을 느꼈지만, 그래도 기대한 것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픽업을 해 주었던 알마티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투어 종료. 그전에,
"How long does it take from Kolsai to Almaty?"
"About 5hours"
하하하...
